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중심이 되고자 한다.
서울박물관 로고
서울역사박물관의 심볼마크는 조선의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시·공간성과 도시성이라는 컨셉 하에 600년 서울역사문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처음 'ㅅ'의 형태는 서울의 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중앙의 반호는 서울의 관문인 4대문과 도성의 이미지를,
또한 마지막 형태는 서울의 한강과 그 터전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을 상징하며, 양쪽으로 뻗은 선은 유구한 역사성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이라는 우리말과 '뮤지엄'이라는 언어적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친근감과 독특함을 주었다.
색채는 파스텔톤의 적색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역사문화가 함께하는 곳으로 활기넘치는 문화중심지를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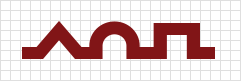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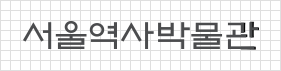
심볼마크 기본형 한글로고타입
한글상하조합

사자석
창경궁 · 종묘 육교 난간석
이 난간석은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였던 육교의 부재이다.
창경궁 · 종묘 육교는 1931년 조선총독부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다리이다.
이후 약 80여 년간 이 육교를 통해서만 창경궁과 종묘를 오갈 수 있었다.
2012년 "창경궁 종묘 연결 복원사업"으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창경궁과 종묘의 아푼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육교 부재를 이전하여 보존하였다.
종루 주춧돌
종루(鐘樓)는 태종 13년(1413년) 종로 네거리에 세워졌다. 세종 22년(1440년)에 개조하여 동서 5칸, 남북 4칸의 규모를
갖춘 후 몇차례의 이동 및 화재와 중건이 있었으며, 고종 32년(1895년) 이후 보신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 전시된 유물은 1972년 지하철 공사 도중 발견 된 종루 주춧돌 11점으로, 그 크기로 보아 조선 전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흥선대원군의 아들 흥친왕의 신도비(興宣大院君의 子 興親王의 神道碑)
흥친왕(興親王) 희(熙), 재면(載冕, 1845~1912)의 신도비(神道碑)이다. 흥친왕은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이다.
처음 이름은 재면이었는데 1910년 국권피탈 직전에 희로 바꾸고 흥친왕에 봉해졌다.
그는 1863년 과거에 급제하면서 규장각 대교, 승정원 거주서를 거쳐 도승지,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 하였다.
이후 1900년 완흥군(完興君)에 봉해졌고, 1910년 8월에는 흥친왕이 되었다.
신도비는 1932년에 건립되었으며 본문은 김윤식(金允植)이 짓고 윤용구(尹用求)가 쓰고, 전자(篆字)는 김성근(金聲根)이 쓴 것이다.
처음에 신도비는 1913년에 경기도 김포군 고란대면 풍곡동에 소재한 묘소에 건립되었는데, 1920년 묘소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이전되었다.
이후 1932년에 비석을 다시 만들면서 비문내용이나 글씨는 이전 것을 그대오 사용하였다. 신도비의 구조는 옥개석, 비신, 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높이는 361cm이고, 옥걔석, 비신, 대석의 높이는 각각 69cm,215cm, 77cm이다.
비신에는제액(題額)으로 "흥친왕신도비명(興親王神道碑銘)"이라는 글귀가 전서로 새겨져 있다.
본문은 전면과 좌측면, 후면에 걸쳐 써져 있다. 대석은 귀否(龜趺)로 만들어 웅장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손자 영선군신도비 · 이우의 신도비 등
흥선대원군의 손자이자 장손인 영선군 이준용永宣君 李埈鎔, 1870~1917과 흥선대원군의 증손인 이우李鍝 1912~1945의 신도비
가장 규모가 큰 비석이 영선군신도비(永宣君神道碑), 그리고 이문용묘갈(李汶鎔墓碣), 글씨가 없는 것이
이우신도비(李鍝 神道碑), 가장 작은 것이 이종묘갈(李淙墓碣)이다.
영선군신도비는 영선군(永宣君) 준(埈), 준용(埈鎔, 1870년~1917년)의 묘비이다. 영선군은 흥선대원군의 손자이자
흥친왕 이희(載冕)의 아들이다. 처음 이름은 준용이었는데 1912年 준으로 개명하였다.
신도비는 1948년경에 건립되었으며 본문은 김윤식이 짓고 윤용구가 쓰고, 전자(篆字)는 김성근이 쓴 것이다.
처음에 신도비는 1919년 고양군 용강면에 소재한 묘소에 건립되었는데 1948년 묘소가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되었다.
이전 뒤에 비석을 다시 만들면서 비문 내용이나 글씨는 이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문용묘갈은 이준용의 동생 이문용(李汶鎔, 1882년 ~ 1901년)의 묘비이다. 1919년에 건립되었는데 전면의 글씨는 김성근이 쓰고, 후면에 있는
음기(陰記)는 김윤식이 짓고 윤용구가 썼다.
이우신도비는 흥선대원군의 증손 우(鍝, 1912년 ~ 1945년)의 묘비이다. 비석에 아무런 글씨가 없는 이른바 백비(白碑)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망 이후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비문을 새기지 못한 듯 하다.
이종묘갈은 이우의 둘째 아들인 이종(李淙, 1940년 ~1966년)의 묘비로 1967년에 건립되었다.
이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폭설로 사망하였다.


이종묘갈(李淙墓碣)
이종묘갈은 이우의 둘째 아들인 이종(李淙, 1940년 ~1966년)의 묘비로 1967년에 건립되었다.
이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폭설로 사망하였다.



영선군 신도비(永宣君 神道碑)
영선군신도비는 영선군(永宣君) 준(埈), 준용(埈鎔, 1870년~1917년)의 묘비이다. 영선군은 흥선대원군의 손자이자
흥친왕 이희(載冕)의 아들이다. 처음 이름은 준용이었는데 1912年 준으로 개명하였다.
신도비는 1948년경에 건립되었으며 본문은 김윤식이 짓고 윤용구가 쓰고, 전자(篆字)는 김성근이 쓴 것이다.
처음에 신도비는 1919년 고양군 용강면에 소재한 묘소에 건립되었는데 1948년 묘소가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되었다.
이전 뒤에 비석을 다시 만들면서 비문 내용이나 글씨는 이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원군 손자 이준용 사망후에 양자가됨


이우 신도비(李鍝 神道碑)
이우신도비는 흥선대원군의 증손 우(鍝, 1912년 ~ 1945년)의 묘비이다. 비석에 아무런 글씨가 없는 이른바 백비(白碑)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망 이후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비문을 새기지 못한 듯 하다.


이문용(李汶鎔, 神道碑)
이문용묘갈은 이준용의 동생 이문용(李汶鎔, 1882년 ~ 1901년)의 묘비이다.
1919년에 건립되었는데 전면의 글씨는 김성근이 쓰고, 후면에 있는음기(陰記)는 김윤식이 짓고 윤용구가 썼다.


흥선대원군의 조부 은신군의 시도비(興宣大院君 祖父 恩信君 神道碑)
사도세자의 넷째아들이자 흥선대원군의 조부인 은신군 이진恩信君 李禛, 1755~1771의 신도비
가운데의 비석이 은신군신도비(恩信君 神道碑), 왼쪽 것이 은신군묘표(恩信君墓表), 그리고 오른쪽의 비석이 낙천군묘
(洛川君墓表)이다.
은신군 진(禛, 1755년~ 1771년)은 정조의 동생이며 게보상 흥선대원군에게는 조부가 된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17세의 젊은 나이에 제주도로 귀양 가 죽었다. 요절한 그를 위해 정조는 즉위 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주었고, 다음임금인 순조는 인평대군의 후손 남연군으로 하여금 그의 가계를 잇도록 하였다.
은신군신도비는 1783년(정조 7년)에 건립되었는데, 형인 정조가 직접 글을 짓고 손수 글씨를 써서 세웠다.
본문에는 은신군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그의 이력과 인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정조의 문장 솜씨와 글씨를 감상할 수 있다.
은신군묘표는 1871년(고종 8년)에 건립되었으며 이재원(李載元)이 짓고 이재면(李載冕)이 글씨를 썼다.
이 묘비는 은신군이 죽고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건립되었는데, 1871년 2월 그의 시호가 소민(昭愍)에서 충헌(忠獻)으로
개정된 다음에 세운 것이다.
낙천군묘표는 낙천군 온(縕, 1720년~ 1737년)의 묘비이다. 1764년에 건립되었으며 본문은 김광진(金光進)이
기록하고 글씨는 신광수(申光綏)가 썼다. 낙천군은 본래 채(埰)의 하들인데, 계보상으로는 연령군의 아들이자
은신군의 부친이 된다.

②恩信君墓表(은신군묘표) ①恩信君神道碑(은신군신도비)
①은신군신도비(恩信君神道碑)
1783년(정조 7년)에 건립되었는데, 형인 정조가 직접 글을 짓고 손수 글씨를 써서 세웠다. 본문에는 은신군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그의 이력과 인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정조의 문장 솜씨와 글씨를 감상할 수 있다.
②은신군묘표(恩信君墓表)
1871년(고종 8년)에 건립되었으며 이재원(李載元)이 짓고 이재면(李載冕)이 글씨를 썼다.
이 묘비는 은신군이 죽고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건립되었는데,
1871년 2월 그의 시호가 소민(昭愍)에서 충헌(忠獻)으로 개정된 다음에 세운 것이다.

洛川君墓表(낙천군묘표)
낙천군 온(縕, 1720년~ 1737년)의 묘비이다. 1764년에 건립되었으며 본문은 김광진(金光進)이
기록하고 글씨는 신광수(申光綏)가 썼다. 낙천군은 본래 채(埰)의 하들인데, 계보상으로는 연령군의 아들이자
은신군의 부친이 된다.
洛川君墓表(낙천군묘표) 받침돌(기단)
마포구 현석동 출토비석 : 시대 = 조선시대 17세기 추정 <이수부분 앞면의 부분도> 2013년 8월에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서 발굴된 비석 이 비석은 2013년 8월에 서울시 마포구 신석초등학교 부근(현석동 108번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중 발굴되었다. 출토당시 받침돌인 좌대 없이 비신만 발견되었으며 표면이 거칠고 비문이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작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 부분의 화려한 조각상으로 보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신도비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주인공을 안 수 없는 미완성 비석이지만 화려한 이수 등 지료적 가치가 있어 2013년 12월에 받침돌을제작하과우리 박물관에 이전 설치하였다. 마포구 현석동 출토비석 : 시대 = 조선시대 17세기 추정 <이수부분 뒷면의 부분도> 마포구 현석동 출토비석 : 시대 = 조선시대 17세기 추정 <전신> 이 비석은 2013년 8월에 서울시 마포구 신석초등학교 부근(현석동 108번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중 발굴되었다. 출토당시 받침돌인 좌대 없이 비신만 발견되었으며 표면이 거칠고 비문이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작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 부분의 화려한 조각상으로 보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신도비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주인공을 안 수 없는 미완성 비석이지만 화려한 이수 등 지료적 가치가 있어 2013년 12월에 받침돌을제작하과우리 박물관에 이전 설치하였다. 난간석의 얻어 놓았던 돌짐승들 [등록문화재 제 467호] 전차381호 일본의 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에서 제작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으로 1930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 시내를 실제로 운행하던 전차이다. 전차 운행 중단 이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전시되다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인수하여 1년간의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부터 박물관 야외에 전시하고 있다. 서울에 남아있는 2대의 노면전차 중 하나로 희소성이 있고 20세기 중반 서울의 교통방식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電車 381호(전차 381호)
이 전차는 1930년경부터 1968년 11월까지 약 38년간 서울 시내를 운행하였다. 서울에서 전차운행이 처음 시작된 날은
대한제국 광무 3년인 1899년5월 17일 이었으며, 운행구간은 서대문에서 청량리가지 였다.
이후 전차는 196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민의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 버스와 자동차 운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자 서울시에서는 1968년 11월 전차운행을 일제히 중단하였다.
이 전차는 서울에 마지막 남은 2대의 전차 가운데 하나다.
2007년 12월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옮겨온 후 1년간의 보존처리과정을 거쳐서 전시하고 있다.
1930년대에 ‘일본차량제조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전차로 1968년 11월까지 약 38년간 서울 시내를 운행한 전차이다.
어린이대공원에 보관되어 있던 전차를 2007년 12월에 옮겨와 제작도면과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복원하였으며
2010년 8월 24일 등록문화재 제467호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 467호 전차 381호

당시의 전차표
[내용 소개]
어느 날 아침 한 중학생이 등교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 바람에 미처 도시락과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채
복잡한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전차를 탄 후 '아차' 하며 난감해 하고 있는데, 전차 밖에는 막내 동생을 들쳐 업은 어머니가 자신이 미처 갖고 나오지 못한 도시락을 들고 쫒아오고,
누이동생은 모자를 들고 뒤이어 따라옵니다. 학생이 '스톱'하고 소리를 지르자 전차 내부에서는 운전사가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놀란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운성 김서경 부부작가와 그 아들 경보, 3인 가족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외었습니다.


장명등(長明燈)
무덤에 불을 밝혀 사악한 기운을 쫓는 등인 장명등(長明燈)
운현궁 일가 묘소에 있던 장명등이다. 장명등은 망자의 혼을 밝게 인도하든가 불을 밝힘으로써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다.
대체로 봉분앞 상석 전방에 배치되는데 묘역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禁川橋(금천교)
경희궁 흥화문 안쪽의 홍예교(무지개다리)로, 광해군 11년(1616년)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에 묻혔다가 2001년 발굴하여 복원하였다.
발굴조사 때 나왔던 유구는 복원시 함께 사용되었다.
홍예(무지개모양)사이에 새겨진 도깨비 상은 대궐 바깥의 나쁜 기운이 궐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상진성을 띠는 것이다.

禁川橋(금천교)
경희궁의 흥화문과 경희궁내의 여러 전각들 사이에 흐르던 금천(禁川)에 놓여진 돌다리, 난간의 돌집승들이나
홍예사이에 새겨진 도깨비 상은 대궐 바깥의 나쁜 기운이 궐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상진성을 띠는 것이다.
1619년(광해군 11년)에 건립되었던 것을 일제가 메몰시켰지만 서울시에서는 2001년에 복원하였다.
慶熙宮(경희궁)과 禁川橋(금천교
경희궁은 조선 후기 왕들이 임시로 거처했던 이궁(離宮)으로, 1617년(광해군 9년)에 창건하여 1620년(광해군 12년)에 완공하였다.
처음에는 경덕궁(慶德宮)이라 하였으나, 1760년(영조 36년)에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으며, 도성의 서쪽에 있다하여 서궐(西闕)이라고도 하였다.
경희궁에는 숙종 · 영조임금이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특히 영조는 경희궁에 대한 글과 글씨를 많이 남겼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았다.
금천교는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興化門) 안에 흐르던 금천(禁川)에 놓여 있던 다리로 1618년(광해군 10년)에 경희궁을 조성하면서 설치하였다.
금천교는 홍예교로 두 개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난간의 돌짐승이나 홍예 사이에 새겨진 도깨비 얼굴은 대궐 바깥의 나쁜 기운이 궁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금천교는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경성중학교가 설립되면서 땅에 묻혔으나 서울역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발견된 옛 석조물을 바탕으로
2001년에 복원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안내 글>

慶熙宮 錦川橋(경희궁 금천교) = 서울역사박물관 앞
禁川橋(금천교)

금천(禁川)에 놓여진 돌다리, 난간의 돌집승들

해돌이, 해순이
해돌이, 해순이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의 예칭이다.
해치는 옛날부터 기쁨과 행운을 주는 상상의 동물이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며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다.
아침의 해처럼 떠오르는 "해"의 기운과 친근한 이름 "돌이" "순이" 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해돌이, 해순이는 사랑받는
서울역사바물관의 마스코트가 될 것이다.
奎章閣學士之署(구장각학사지서)
규장각 수교 주련
客來不起(객래불기) :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말라
閣臣在直△冠坐椅(각신재직△관좌의) : 각신은 근무 중에는 반드시 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
凡閣臣在直非公事毌得下廳(범각신재직비공사관득하청) : 각신은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니면 청을 내려가지 말라
毌 :꿰뚫을 관<현재이자는 아예 쓰지를 않는다.>
雖大官文衡非先生毌得升堂(수대관문형비선생관득승당) : 비록 고관 대신일지라도 각신이 아니면 당위에 올라오지 못한다.

①見□客不起(견□객불기) ②非先生勿入(비선생물입)
규장각에서의 날들
영조의 뒤를 이어 등극한 정조는 노론 우위의 정국을 타개하고 남인세력을 본격적으로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중간 계층을 국왕과 직접 연결시켜 재편성함으로써 편파적 상황의 탕평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백탑파는 뛰어난 학문 실력으로 새로운 힘이 되어 줄 튼튼한 지원군이 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눈여겨보던 정조는 마침내 그의 측근 관료로 살게 될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규장각 검사관으로 바쁜 공무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전쟁의 폐해를 피해 한양을 떠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수록 백탑 인근에서의 모임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한숨짓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홍대용, 거문고의 대가
홍대용은 다양한 재주를 지녔던 인물로, 당대 유명한 거문고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속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거문고 만큼 좋은 악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소양자체가 뛰어나, 연행으로 천주당에 갔을때 처음 본 파이프오르간의 건반을 몇번 눌러보고는
바로 거문고 악보에 맞춰 곡을 그럴싸하게 연주해 내 서양 신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악기인 양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조 연주법을 개발했습니다.
세상만사가 원래 하늘의 정함은 꾀할 수 없나니,
내집에 잇는 거문고 묘한 소리 터질 땐 마음이 편안하노라
홍대용,「담헌서」「詩 친구의 운을 따서 이국옹에게 부침 」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악기인 洋琴(양금) : 시대 = 조선
마테오 리치에 의해 1580년 경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홍대용은 연행을 다녀오면서 양금을 구입해 와 스스로 연주방법을 터득하였다.
竹裡彈琴(죽리탄금) : 시대 = 18세기, 작가 = 김홍도
밝은 달밤에 대나무밭에서 한 선비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고, 그 뒤에서 동자가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山水人物畵帖<彈琴觀月>(산수인물화첩< 탄금관월>)
산수인물화첩(山水人物畵帖) 중 한 폭으로, 거문고를 타며 달을 감상하는 모습을 그렸다.
菊花圖(국화도) : 시대 = 18세기, 작가 = 박지원
단호흉배
太平城市圖(태평성시도)
太平城市圖(태평성시도)
折梅著句圖(절매저구도)
매화가지를 꺽어 화병에 꽂아 높고 이를 감상하며 시구를 짓는 선비의 모습을 그렸다.
절재된 필선과 담채로 묘사되어 차분한 선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이방운
고려대학교 박물관
芭蕉題詩圖(파초제시도) : 19세기 작가 = 이재관
값비싼 종이 대신 파초잎에 글씨를 연습했다는 한 고사로 인해 문인들은 파초잎에 시를 쓰는 일을 매우 아취 있게 여겼다.
平渾儀(평혼의) : 시대 = 19세기
박규수가 평면의 원에 남 북반구의 별자를 표시한 것으로,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 시간과 계절을 측정할 수 있다.
청계천 다리
청계천 다리
'불화이야기=고려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전인 폼페이 전시보고, 특별전 : 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 (0) | 2015.04.09 |
|---|---|
| 서울역사박물관 (0) | 2015.02.28 |
| 경천사 십층석탑. 물가풍경 무늬 정병 (0) | 2015.02.10 |
| 국립고궁박물관 = 특별전, 류큐왕국의 보물전, 고국으로 돌아온 데라우치문고 (0) | 2015.01.24 |
| 국립고궁박물관 = 특별전 관람하고서 일반실 관람함 (0) | 2015.01.24 |
































































